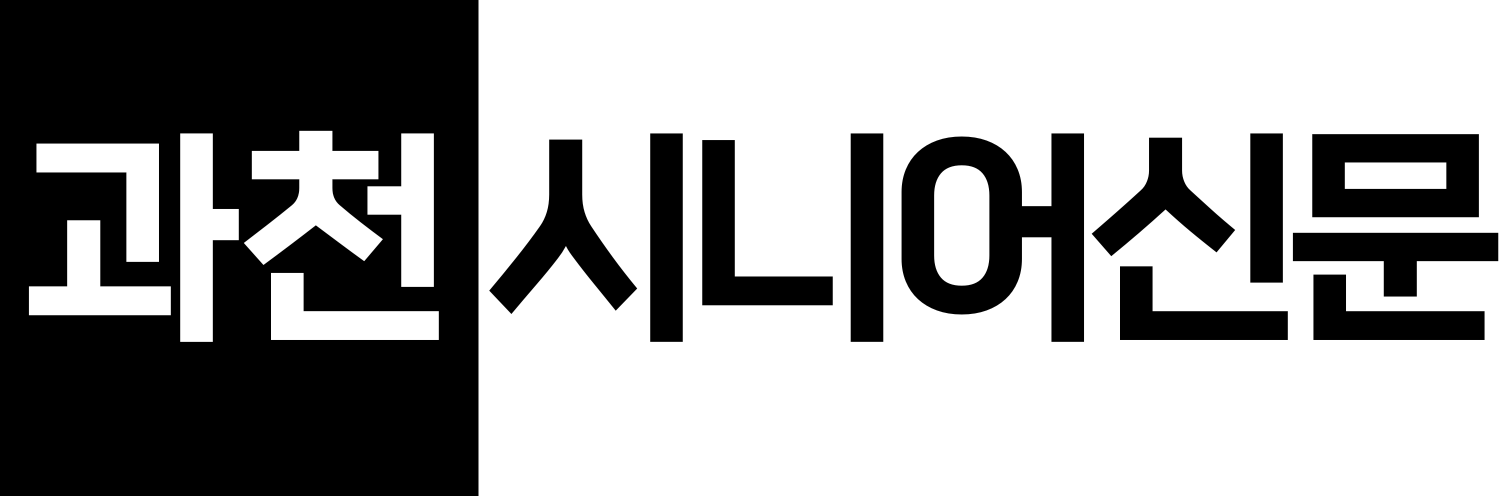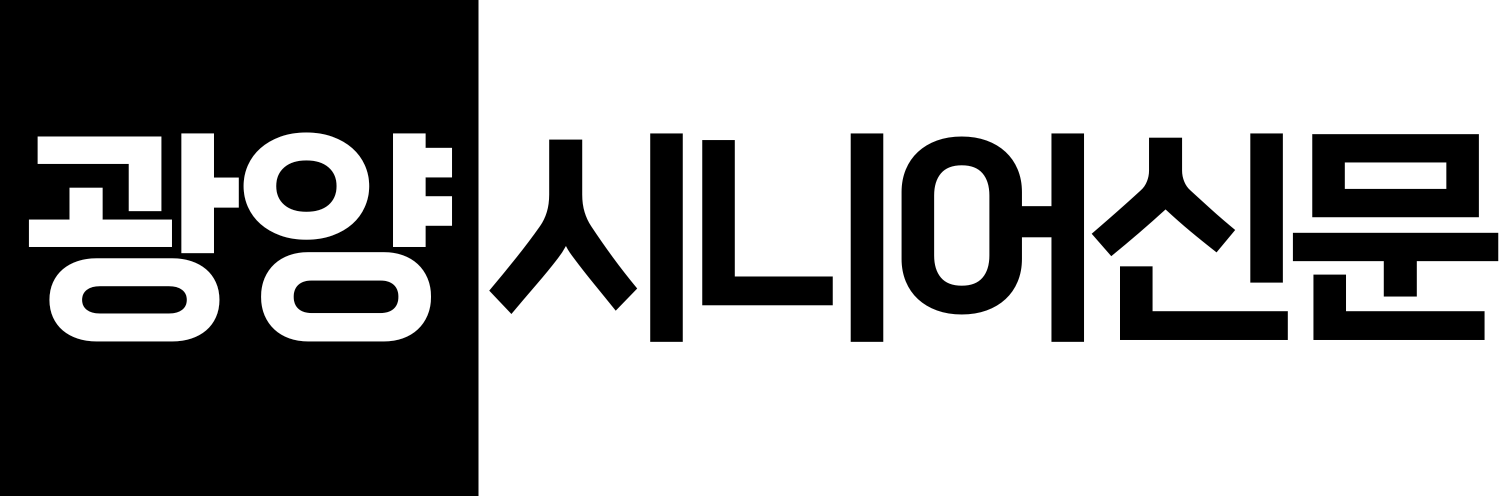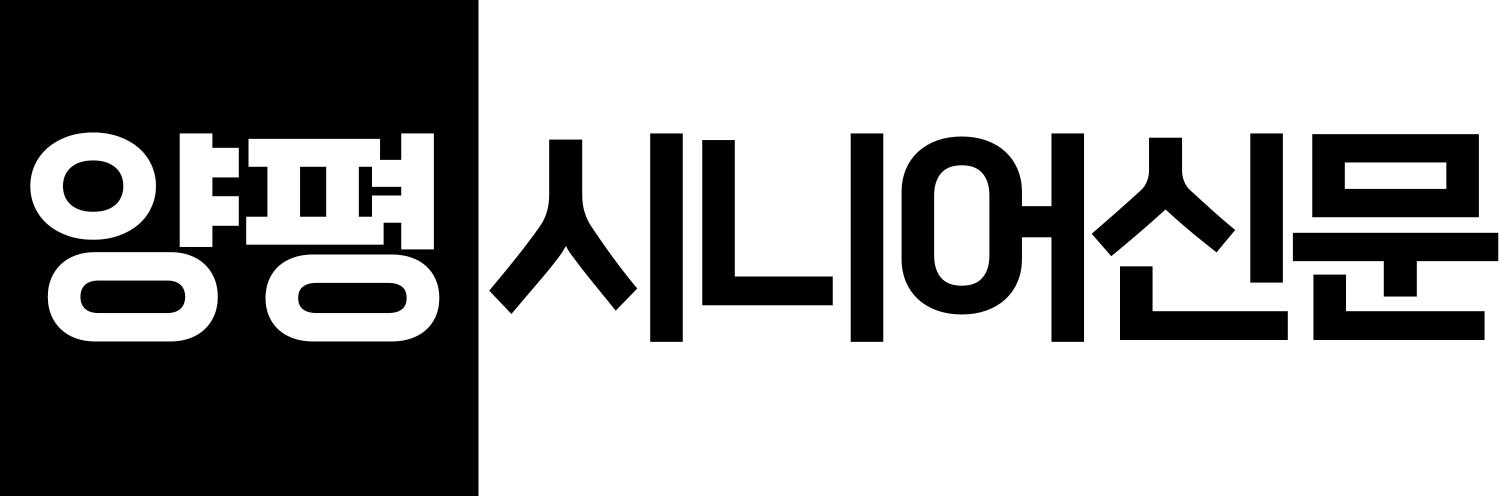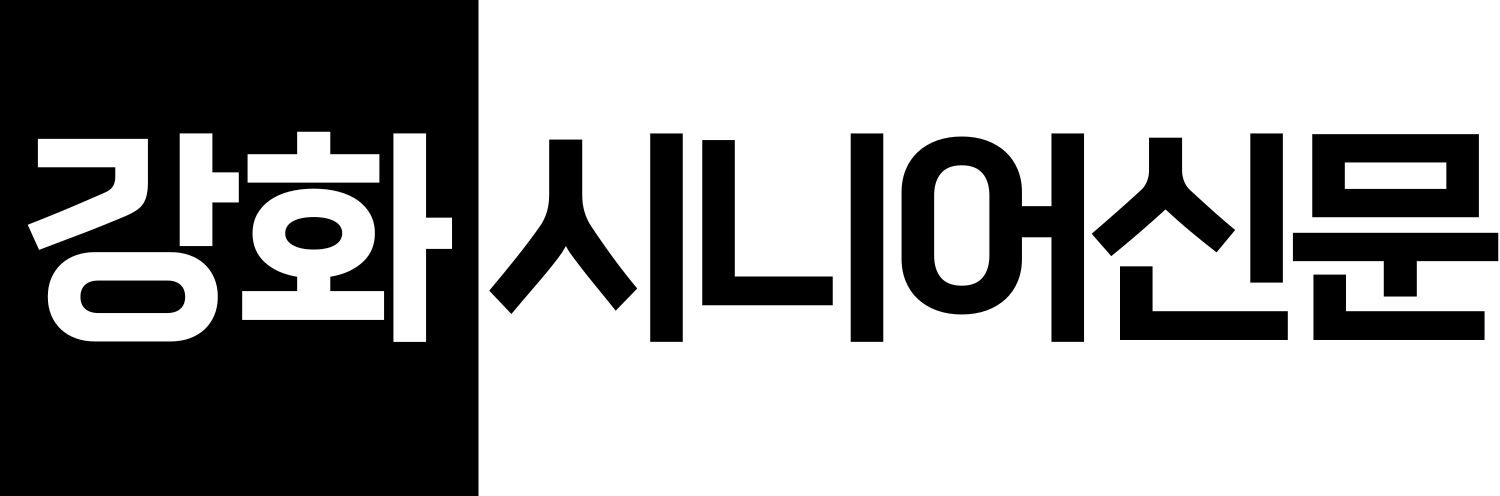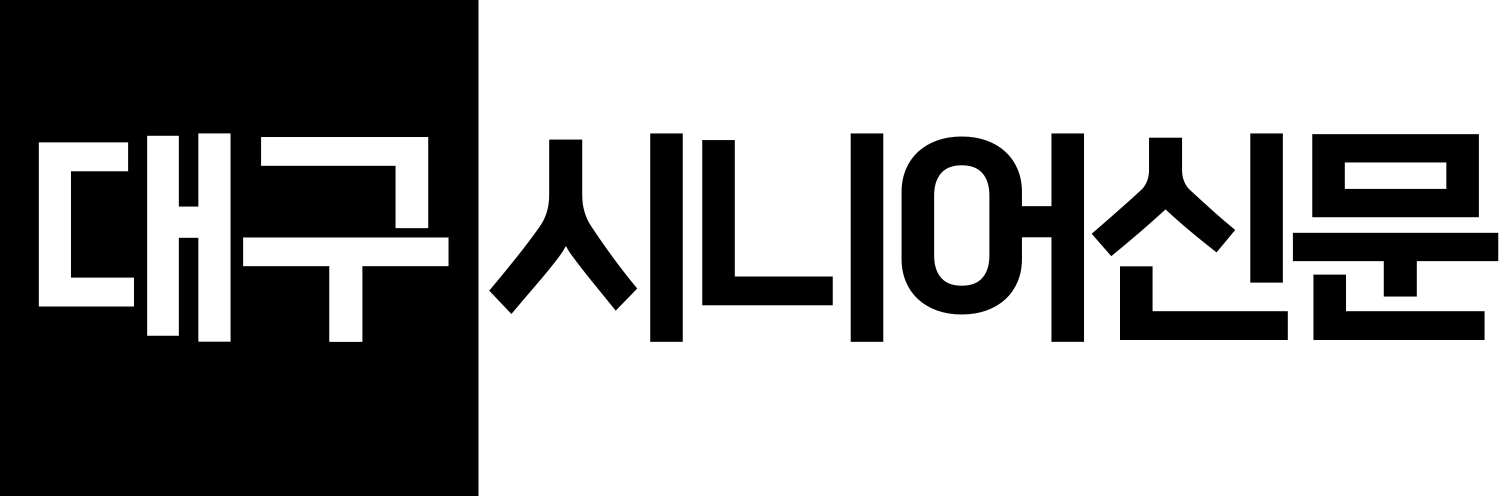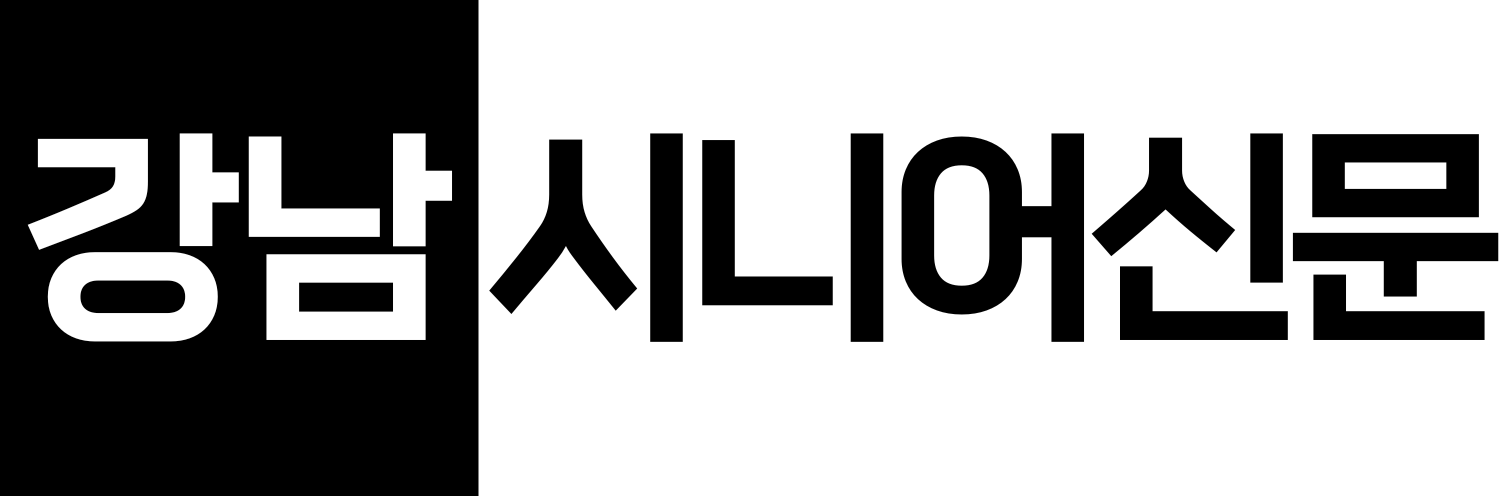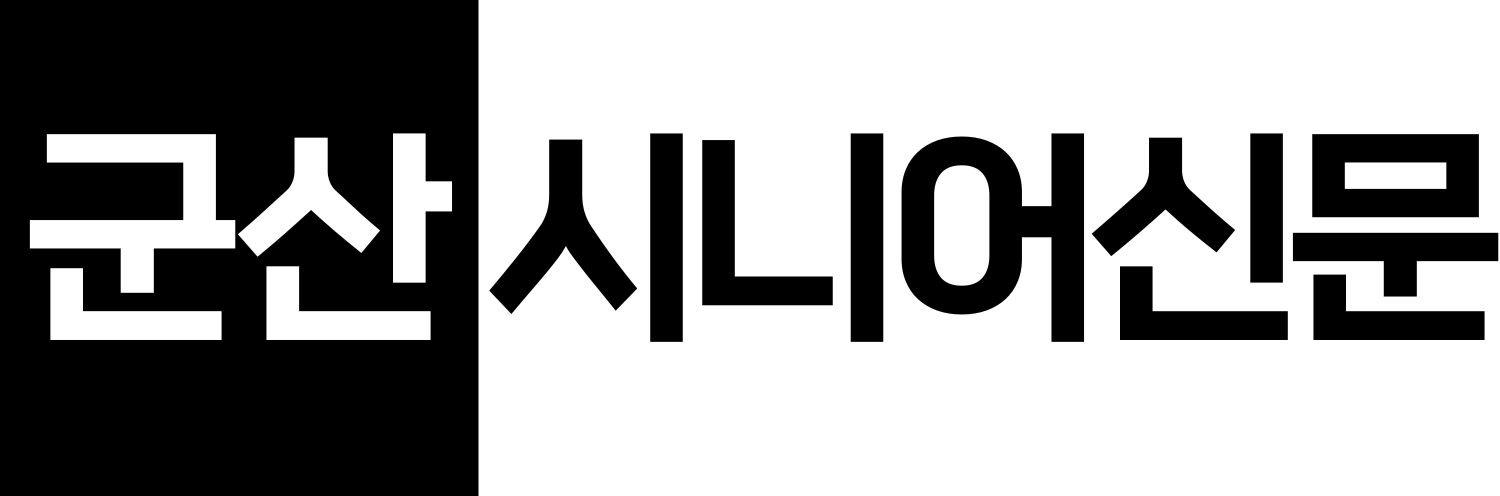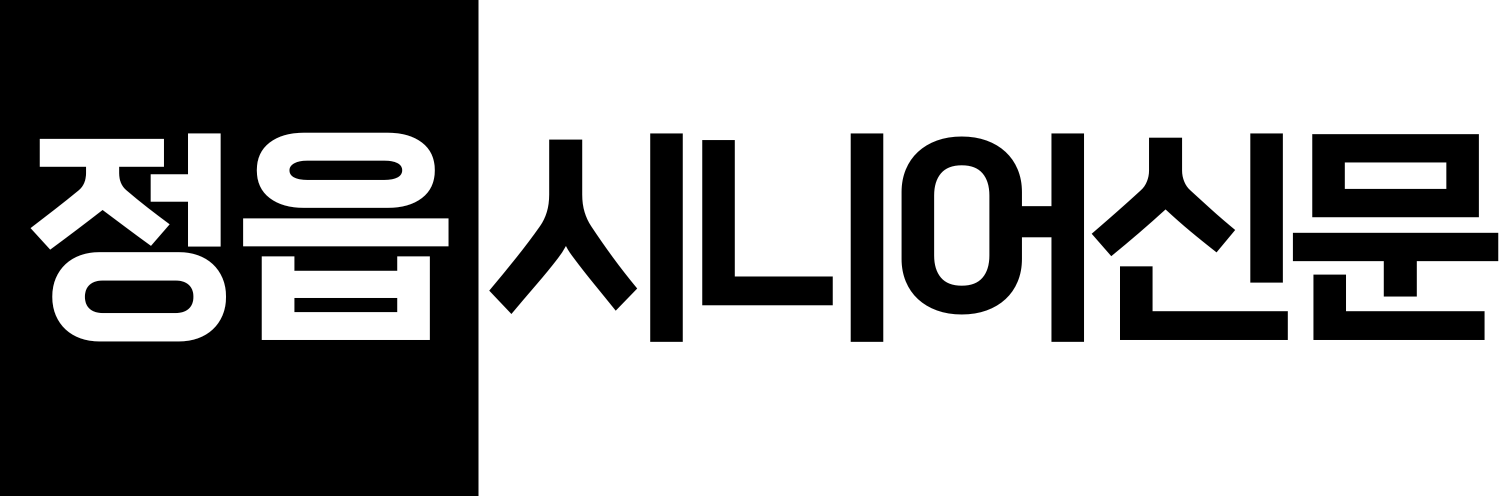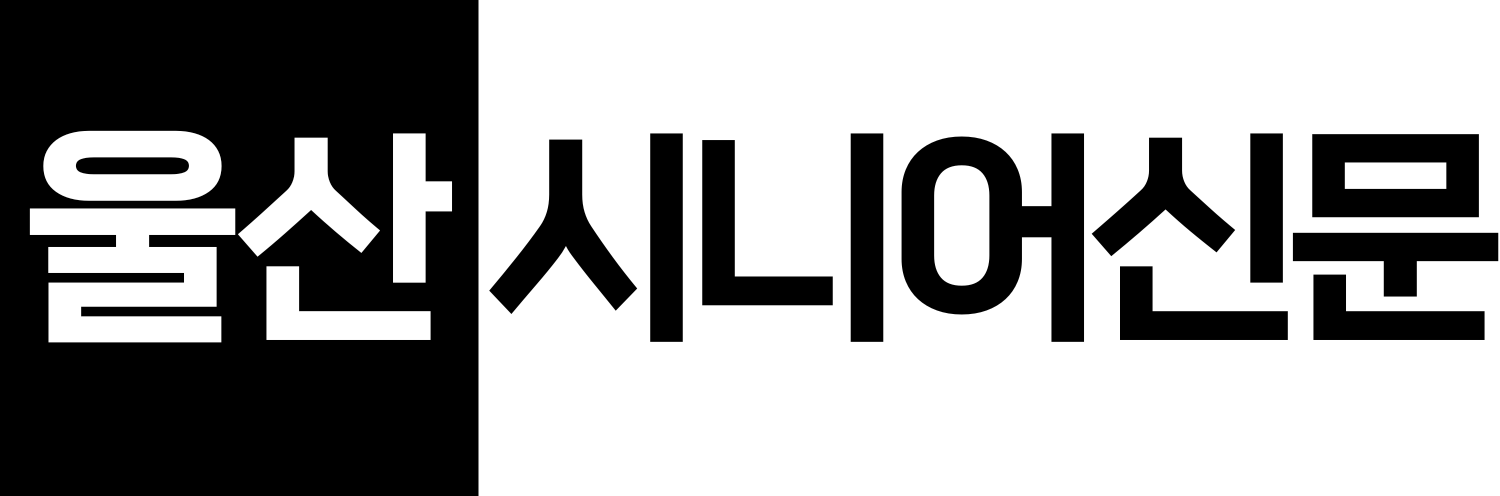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은 문제인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은 2030년 원자력 발전량과 재생에너지의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이고 원자력은 20%에서 30%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저탄소 전원을 필요로 하는 RE100 클럽이나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기후협약에서 주장하는 40%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20%로 후퇴한 정책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학자나 시민사회 사람들은 늘 독일의 정책을 본 받으라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한국도 태양광 발전의 본고장 독일과 같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독일은 태양광 발전을 규모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나라로 유명하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면, 발전 시설 건설을 위해 삼림 등을 벌채하면, 그 6배의 식림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양광 발전소를 위해 산지 30ha 조성해 활용하면 그 3배인 90ha의 땅을 다른 곳에서 확보하고 나무를 심어 이를 25년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했다.
신규 개발 부지의 동물(황새 매 등 멸종위기 보호 종) 보호 규제도 엄격히 요구돼 신규발전부지내에 보호 기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면 인공적인 이전 둥지를 조성해야 발전 부지로 활용 가능하다.
수명이 다한 발전소 해체를 위해 사업주는 국가에 공탁금을 지불하여 만약 해당 사업자가 도산했을 경우는 국가가 대신해 폐지 작업을 실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모듈 등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역시 독일이다. 우리는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과 모순을 지적하는 일이 자주 있지만, 이러한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개발을 진행시켜 나가는 자세에는 배울 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
해남군과 국내 산지 태양광의 예다. 독일과 같은 규제가 없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개발에 의한 삼림의 상실은 영원한 것이다. 단순히 경관 문제가 아니라 경사지 숲이 사라지면 그 바로 아래나 옆에 서 있는 주거지는 산사태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회(안병길 위원)에서 산림청과 KEI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 가운데 KEI가 산사태 방지 등 안전 차원에서 제시한 ‘평균 경사도 10도 미만, 최대 경사도 15도 미만’ 조건에 미달하는 곳은 전체 3684곳 중 2057곳에 달했다. 55.8%가 위험하단 뜻이다.

“기후변화로 기록적 폭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산 비탈면에 시한폭탄을 깔아놓은 꼴”이라고 했다. 산림청은 “법 개정 이전에 신청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평가와 같은 것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느슨한 규제 속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키고 자연환경도 보호하며 태양광 발전의 발전용량이 증가 돼야하며 좁은 국토에서 20년 이상 노천에 사용해야할 시설물 임을 고려 할 때 필요하면 지금까지의 용량늘리기에 급급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