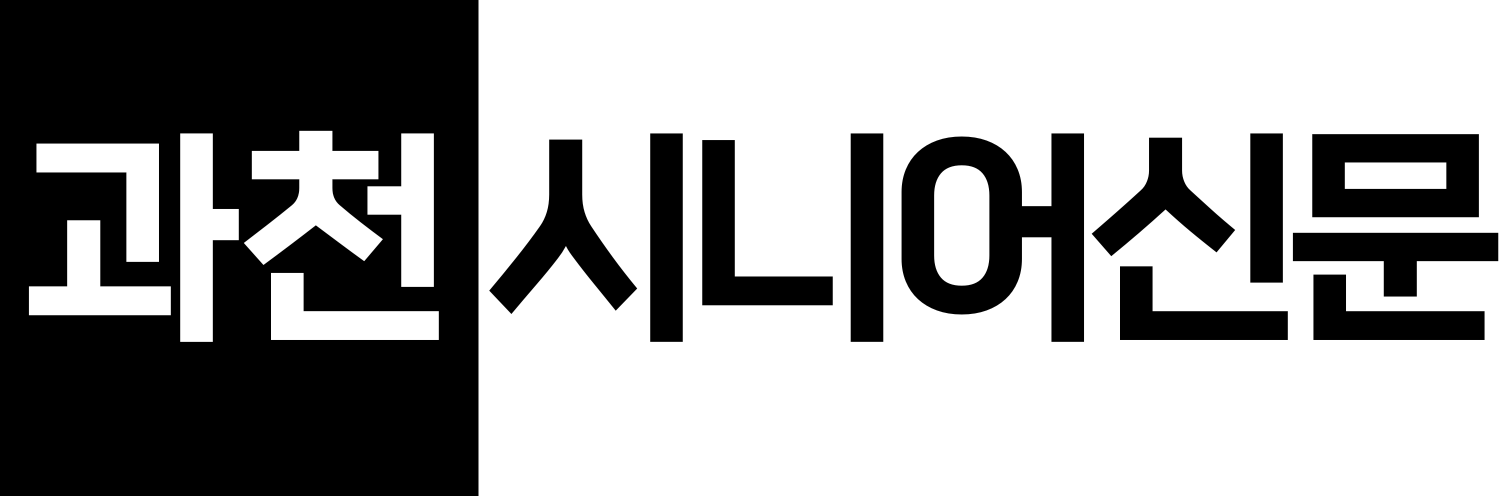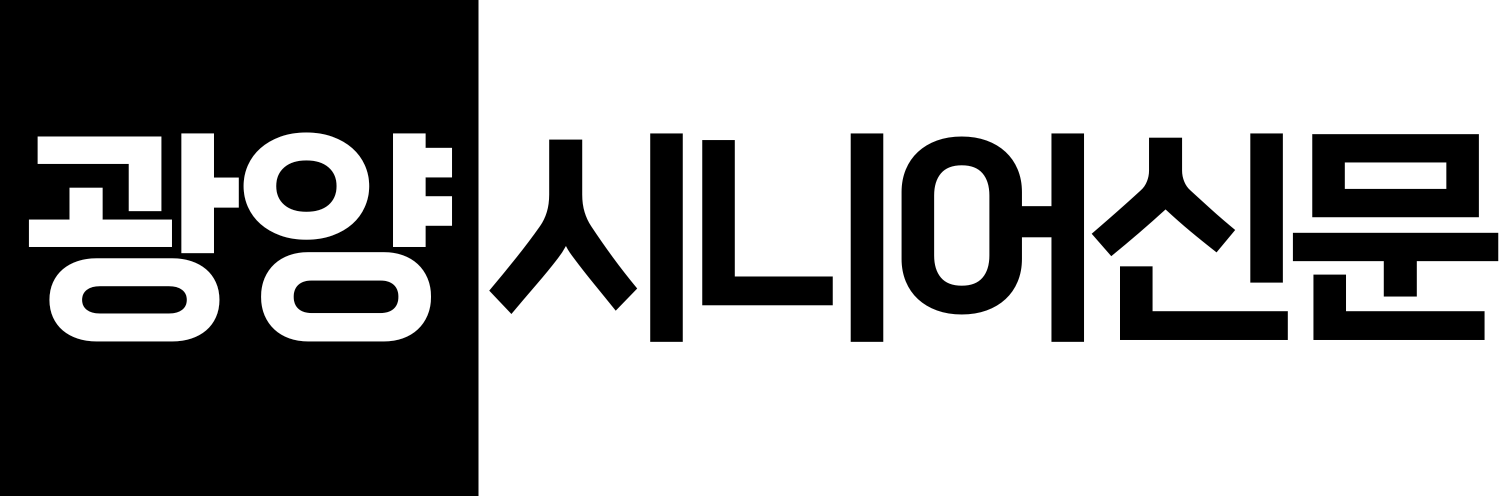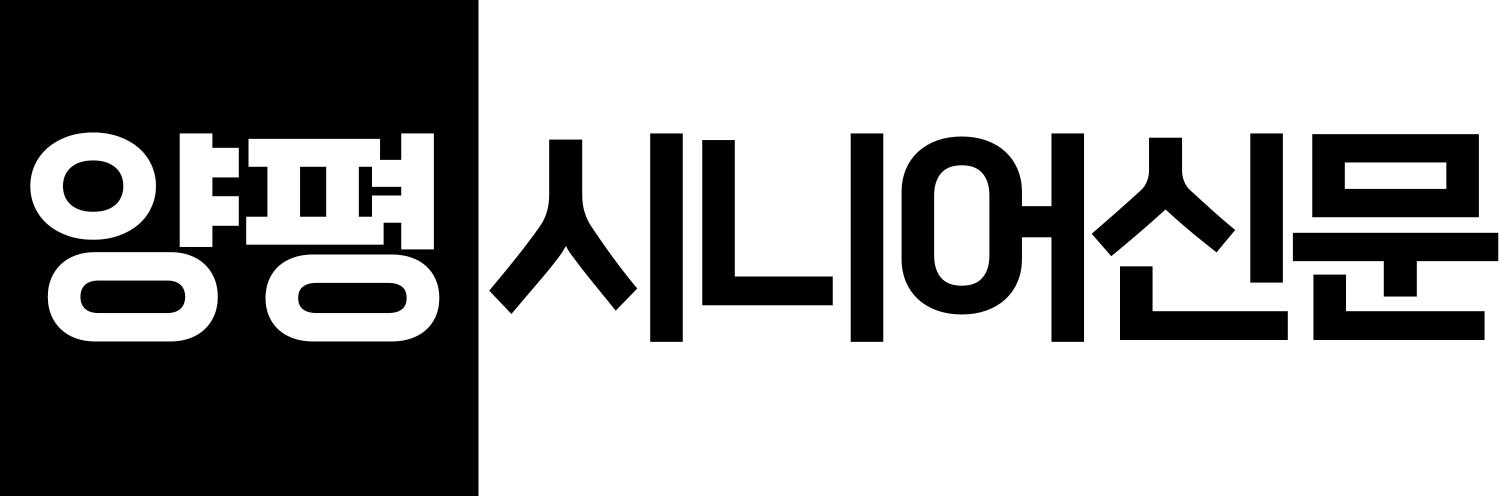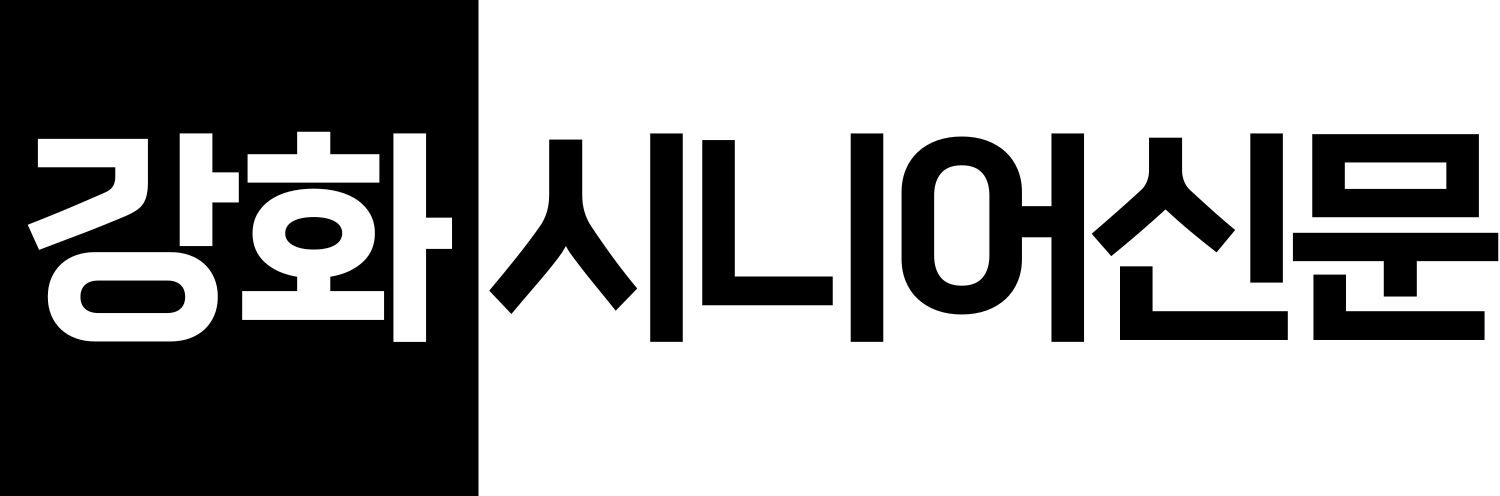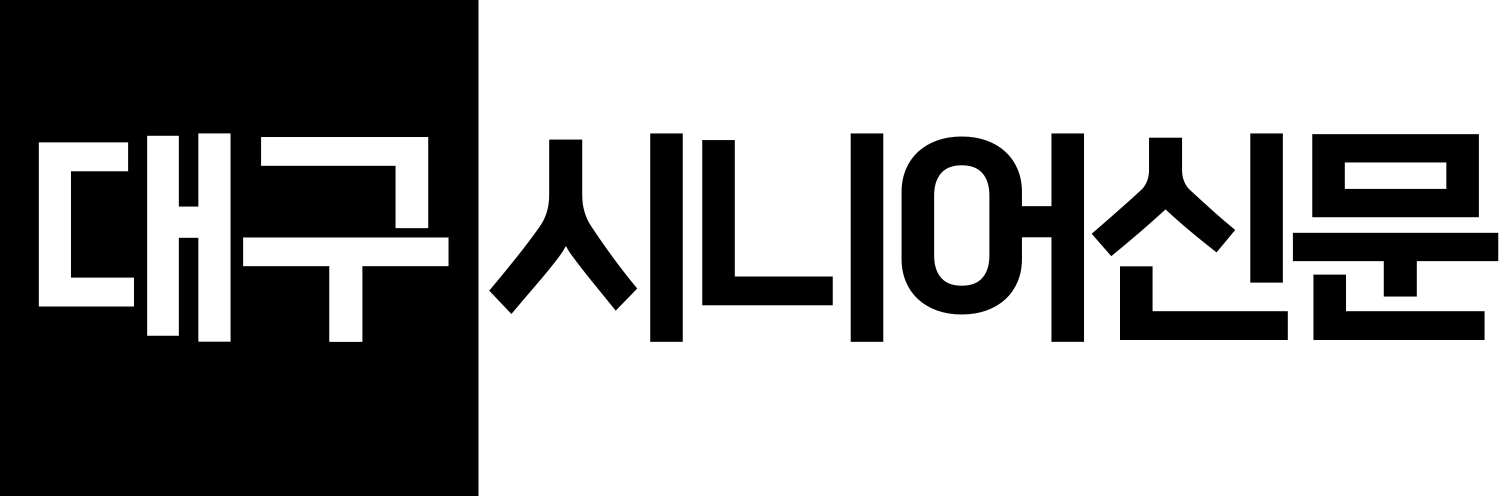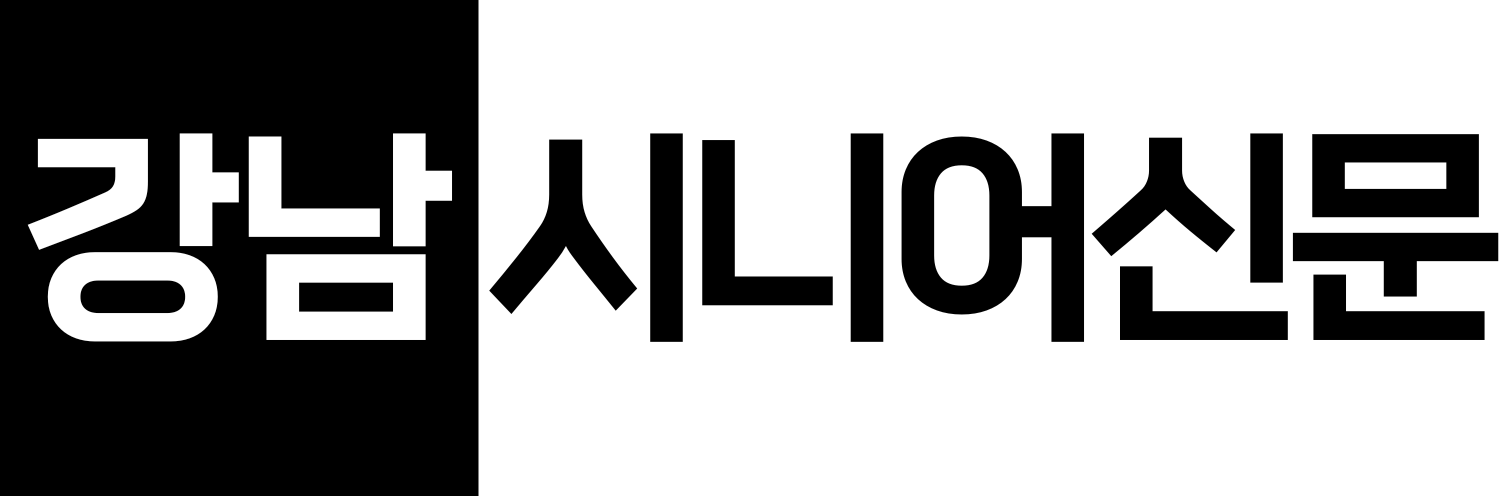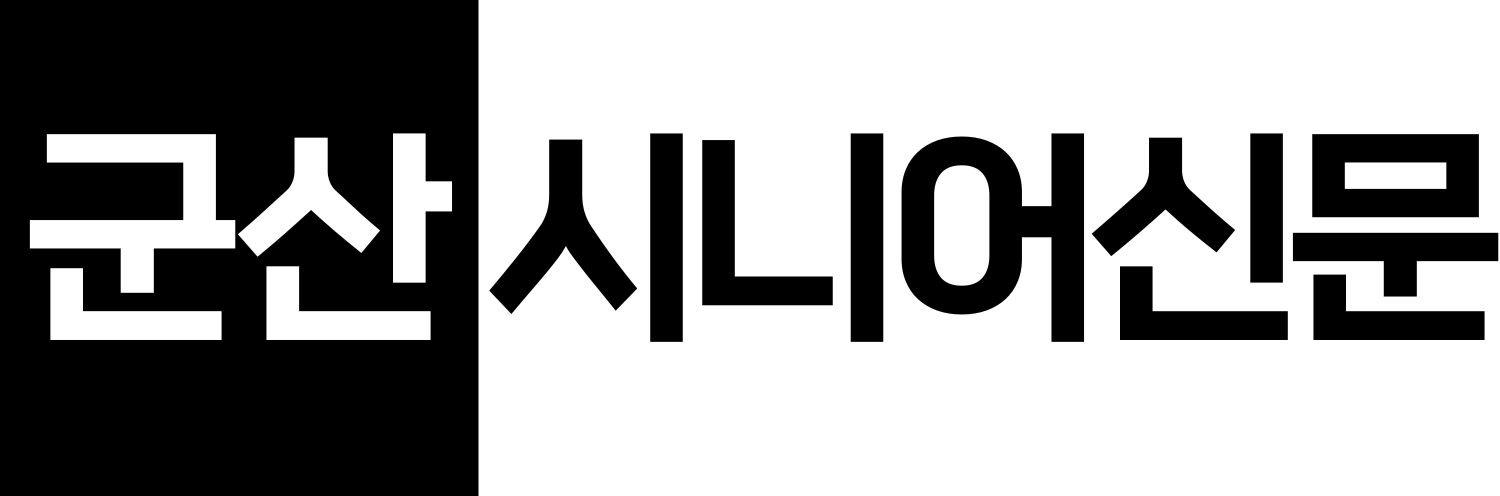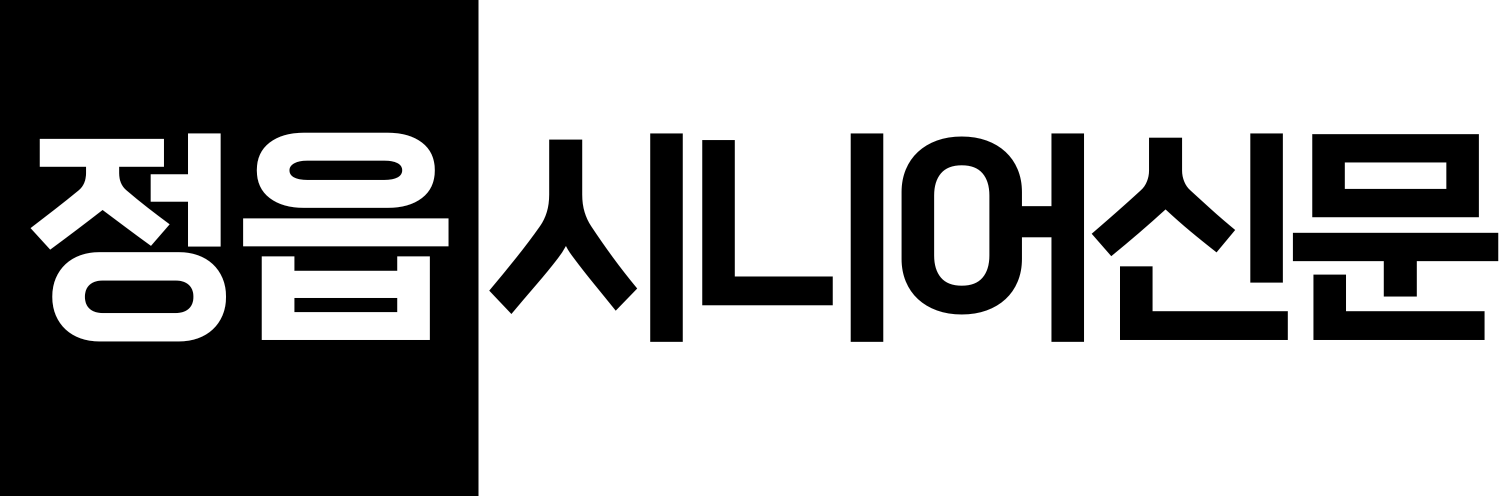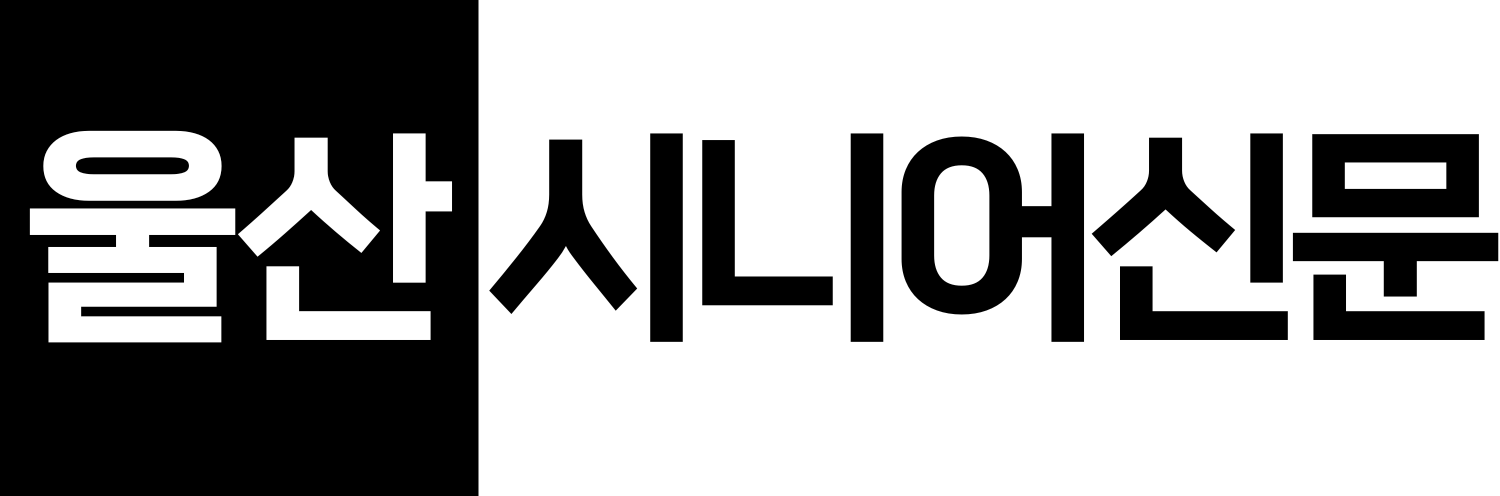[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주먹구구식 귀농귀촌지원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제도적 지원 이전에 농업과 농촌을 먼저 살리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극복입니다. 또한, 이른바 ‘6차산업’ 활성화 방안도 중요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보다 시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들을 펀드 등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짚어봅니다.
귀농귀촌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촌가구는 2020년 344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귀농귀촌의 급격한 증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시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다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이 가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2015년 12월 23일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귀농귀촌지원법)이 시행됐다.
귀농귀촌지원법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방식에서 탈피,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귀농귀촌지원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 귀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귀농귀촌 통계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귀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어 이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귀농어 창업이나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귀어·귀촌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민간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했고, 10가구 이상의 귀농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특화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된 지역 특화형·맞춤형 지원과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원주민과의 공생·공존·공영 방안 시급”
전문가들은 귀농귀촌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보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먼저 살리는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맹목적인 인구유치정책이 아니라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공생·공존·공영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유상오 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은 “2018~2022년, 읍면 주민 대 귀농귀촌인 비율이 87:13, 농민 대 귀농귀촌인 비율은 65:35로 전환돼 행정리의 경우 귀농귀촌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유 원장은 “귀농귀촌인이 증가할 경우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물론, 농업에 대한 이해부족, 지역 전통 무시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맹목적으로 인구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이 아니라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공생·공존·공영 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유 원장은 “귀농귀촌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경험, 기술, 네트워크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판매와 농촌관광과 같은 농어업의 성공적인 6차산업화에 꼭 필요하다”며 “이주민들이 원주민과 협력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농조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마을단위 협력형 소득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오 원장은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확대도 주문했다.
유 원장은 “2035년이면 300만~400만명 정도의 인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도향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예산 배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유 원장은 “2015년 기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예산은 28만명을 대상으로 1100억원, 통일부의 새터민 예산도 2만8000명을 대상으로 1231억원이 책정됐으나 농림부의 귀농귀촌 예산은 145억원에 불과하며, 2014년 159억에서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 귀농귀촌인구가 8만명을 넘어섰는데, 2015년 정부가 지원하는 귀농 전단계 교육인원이 2800명, 농촌진흥청 실습인원도 517명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예산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농촌 살리는 농업정책 선결돼야”
귀농운동본부 부설 귀농정책연구소 관계자도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업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농업을 살리는 농업정책이 아니라면 귀농정책도 한계가 분명하다”며 “최근 귀농귀촌을 새로운 유망산업, 블루오션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이어 “청년귀농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귀농교육을 수준별로 차별화, 세분화하고, 지원도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1인 귀농자 비율이 69.3%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도 귀농인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성이 먼저 귀농귀촌해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단계를 거친 뒤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경향을 감안해 1인 귀농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귀농귀촌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농지와 주택문제인데, 원주민과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농지나 빈집을 귀농인에게 임대할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6차산업 발전 위한 투자제도 마련해야”
단순한 농업생산만으로는 농촌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만큼,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6차산업으로 상징되는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한 제품과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결합,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융복합산업정책은 이른바 ‘6차산업화’ 정책으로 불리며, 농촌지역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들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융복합산업 생산물이 대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시장우위에 서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아무리 제품과 서비스가 좋아도 개별 경영체가 홀로 마케팅을 펼쳐서는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어 “지역축제나 지역판매장에서 해당 지역의 융복합산업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역단위에서 확대 소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역단위 소비 전략 수립의 경우 시장의 수요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투자로 인한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한 시설 및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융복합산업화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 등을 활용,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보조금 방식을 벗어나 투자의 형태로 재원이 마련된다면 정부의 리스크도 줄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